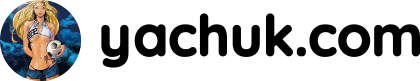수중전의 추억
?며칠 전에는 비가 많이 왔다. 이젠 비가 오면 막걸리에 파전 생각만 날 뿐인데다 점점 버스에서 ‘학생’하고 부르는 것 보다 ‘아저씨’하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창시절에는 비가 오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 체육시간이 되어도 축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육시간이 있는 당일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날 비가 왔더라도 다음날 축구를 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줬다.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생기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창시절 임했던 수 많은 자잘한 경기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들은 대부분 수중전이다. 어쩌다 비 오는 날 축구를 하게 되었는지 시작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흠뻑 젖은 교복, 빗방울이 맺힌 머리카락, 흙탕물 색이 된 실내화 그리고 빗방울 사이로 몽글몽글 피어 오르던 김이 생각난다. 수중전은 항상 즐거웠다. 빗물이 고인 물웅덩이에 공이 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 하프발리슛이 나오기도 했다. 시야를 가리던 빗줄기는 어느새 축구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수중전은 극장 경기로 이어졌다. 골이 들어가면 부서질 듯 얼싸 안고 방방 뛰었다. 비를 맞고 축구 하느라 감기에 걸려 학원에 빠질 지 언정 그 경기에 비장하게 임했다. 왜였을까? 확실한 건 한 가지다. 우리는 그 때 빗속에서도 김을 낼 만큼 열정적이었다는 거다.
 수중전에서 골을 넣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하이파이브를 하곤 했다.
수중전에서 골을 넣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하이파이브를 하곤 했다.그 땐 왜 그렇게 축구가 좋았는지 그 시절 연습장엔 온통 같은 반 애들로 꾸릴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가죽이 벗겨진 공을 매직으로 칠해 제법 그럴 듯한 피날레로 만들기도 했다. 지금에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 만만해 보이는 선생님께는 수도 없이 체육 시간도 아닌데 축구를 시켜달라고 했다. 쉬는 시간 10분, 그 짧은 순간에도 어떻게든 공을 차고 땀을 냈고 체육대회라도 열릴 양이면 투표를 해서 동대문에 ‘짝퉁’ 유니폼을 맞추러 가곤 했다. 그 때 우린 반봄멜이었고, 훈텔라르였고, 카윗이었다. 그래서인지 학교를 가는 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곳에서 유니폼을 사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곳에서 유니폼을 사 본 적이 있을 것이다.?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10년 전이다. 그 시절에 함께 했던 친구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잠수 중이거나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거나 대학원 모임에 나가느라 시간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풀코트는 고사하고 풋살을 할 인원을 모으는 것도 어려워 진지 오래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학창시절의 열정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가끔 오랜만에 만나 맥주 한 잔 할 때 마다 우리 모두 비 오던 날의 축구를 추억하곤 하는 걸 보면 아직 그래도 마음 속 한 켠에는 그 때 그 열정이 남아 있다는 걸 느낀다.
물론, 우리의 열정적 수중전이 밖에서 보기엔 이랬을 가능성도 높다
?대학에 오고 취업 준비를 하고 연애도 하면서 축구가 점점 멀어지는 건 이 사회를 살면서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즐겁게 했던 일이 학창시절의 추억으로만 남는 것은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당장 그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을 만들기를 권한다. 사람이 부족하다면 다른 친구들을 끌어 와서라도 다시 공을 잡고 주말에 나서 보기를 바란다. 무거워진 몸에 체력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을 수도 있다. 그래도 축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한다. 매 주 찰 때마다 추억이 만들어질 것이고 몸도 더 가벼워질 것이다. Ajaelization(아재화)도 축구를 통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리고 추억 속의 친구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멋진 일이지 않은가?
?실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시절 수중전이 재미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선수처럼 잘했기 때문은 아니었지 않은가? 축구를 놓고 살았다면, 다시 한 번 당장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