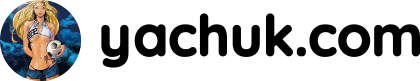유럽 축구를 몰랐다. 어릴 적 내가 접할 수 있는 축구는 오직 '대한민국' 축구였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주는 K리그 티켓과 아버지와 같이 보는 국가대표 경기. 이 두 가지가 내가 접할 수 있는 축구의 전부였다. 자전거 타고 동네 경기장에 가면 꽁짜로 축구를 볼 수 있었다. 누구보다 패스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수, 모자를 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골키퍼 그리고 지금은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지만 후반 막판이면 경기장에 들어와 골을 넣는 선수. 어린 나이라 '내 팀'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 경기라도 안나오는 선수가 있다면 아쉬워 할 정도로 선수들과 '정'이 들었다. 새벽에는 아버지와 티비 앞에 앉았다. 치킨은 먹지 않았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엄마가 안방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최대한 조용히 축구를 시청하기를 원하셨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나라 선수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어도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지금은 혼자 소리를 지르는게 민망해 소리를 지르지 못하니 어쩌면 아버지와 눈으로만 웃었던 그때가 가장 기뻤을 지도 모른다. 내 마음 속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축구엔 로망이 있다.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브라운관 티비 앞에서 아버지와 숨 죽인채 경기를 보고, K리그와 국가대표에 열광하고, 경기 장 앞에 파는 김밥과 메케한 연기를 내뿜는 닭꼬치를 천원짜리가 없어서 못사먹던 기억. 지금 애들이 보면 "꼰대가 축구 얘기하네?"라고 나를 비웃을 수 있지만, 나와 함께 축구를 보았던 사람들은 알거다. 그 시절 대한민국 축구의 로망에 갇혀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국뽕이랄까.
 그때는 국가대표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신문까지 봤다. 아홉시 뉴스가 끝나고 하는 스포츠 뉴스, 신문 스크랩 그게 내가 축구를 볼 수 있는 전부였다. 우리나라 선수 이름이 뭔지, 상대편 나라의 선수는 누군지 일단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대로 봤다. <부천SK>, <1998년 월드컵>, 월드컵이 자주 열리는 줄만 알고 직관 가지 않았던 <2002년 월드컵>까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축구를 1도 모르는 나에게 축구에게 반하게 했던 '윤정환'과 모자 쓴 골키퍼 '이용발'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천SK의 '특급 조커'였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나에게 그들은 그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이자 선수였다. <1998년 월드컵>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국가대표 팀과 상대 국가대표 팀 그저 그렇게만 구분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한 명의 선수를 소개해줬다.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다." "그런데 월드컵에 나왔다. 대단한 선수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넌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에둘러 말씀 하셨나 보다. 그 때 부터 이동국을 너무 좋아했다. 지금도 그의 18살 시절 플레이를 본다. 어쩌면 그가 네덜란드 전 몇 분에 교체 투입 됐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02년 월드컵>은 온 국민이 축제였지만, 나에게는 아니였다. 부천SK가 축구를 하던 곳에 사람이 모였고, 전광판으로 2002년 월드컵을 보았다. 안경을 쓰고 가지 않아 희미하게 전광판 화면을 봤다. <2002년 월드컵>을 축제로 즐기기엔 나의 시력도, 나이도 완전치 못했다. 그래서 남들 보다 <2002년 월드컵>을 희미하게 기억한다. 그래도 슬플 때는 <2002년 월드컵> 영상을 찾아 그 때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린다. 부천SK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동국이 뛰는 <1998년 월드컵>을 이어서 보다 보면 어렸을 적 기억으로부터 위로 받는다. 너무나 국뽕이지만 최대한 국뽕스럽게.
그때는 국가대표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신문까지 봤다. 아홉시 뉴스가 끝나고 하는 스포츠 뉴스, 신문 스크랩 그게 내가 축구를 볼 수 있는 전부였다. 우리나라 선수 이름이 뭔지, 상대편 나라의 선수는 누군지 일단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대로 봤다. <부천SK>, <1998년 월드컵>, 월드컵이 자주 열리는 줄만 알고 직관 가지 않았던 <2002년 월드컵>까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축구를 1도 모르는 나에게 축구에게 반하게 했던 '윤정환'과 모자 쓴 골키퍼 '이용발'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천SK의 '특급 조커'였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나에게 그들은 그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이자 선수였다. <1998년 월드컵>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국가대표 팀과 상대 국가대표 팀 그저 그렇게만 구분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한 명의 선수를 소개해줬다.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다." "그런데 월드컵에 나왔다. 대단한 선수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넌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에둘러 말씀 하셨나 보다. 그 때 부터 이동국을 너무 좋아했다. 지금도 그의 18살 시절 플레이를 본다. 어쩌면 그가 네덜란드 전 몇 분에 교체 투입 됐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02년 월드컵>은 온 국민이 축제였지만, 나에게는 아니였다. 부천SK가 축구를 하던 곳에 사람이 모였고, 전광판으로 2002년 월드컵을 보았다. 안경을 쓰고 가지 않아 희미하게 전광판 화면을 봤다. <2002년 월드컵>을 축제로 즐기기엔 나의 시력도, 나이도 완전치 못했다. 그래서 남들 보다 <2002년 월드컵>을 희미하게 기억한다. 그래도 슬플 때는 <2002년 월드컵> 영상을 찾아 그 때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린다. 부천SK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동국이 뛰는 <1998년 월드컵>을 이어서 보다 보면 어렸을 적 기억으로부터 위로 받는다. 너무나 국뽕이지만 최대한 국뽕스럽게.